어떻게든 공연장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최대한 살리고자 공연 후기는 잠들기 전에 무조건 마무리를 짓겠단 생각으로 쓰지만, 어제 공연은 후기를 열심히 쓰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버려 더 무리하면 출근도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루를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공연장에서 느꼈던 좋은 기억들이 다소 날아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
종종 보는 공연 소식들을 보면 끌리는 프로그램이 몇 있긴 했지만 귀찮아서, 혹은 바빠서 안 가곤 했다. 이번 공연도 프로그램은 죄다 좋아하는 곡들인지라 가볼까? 란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어찌저찌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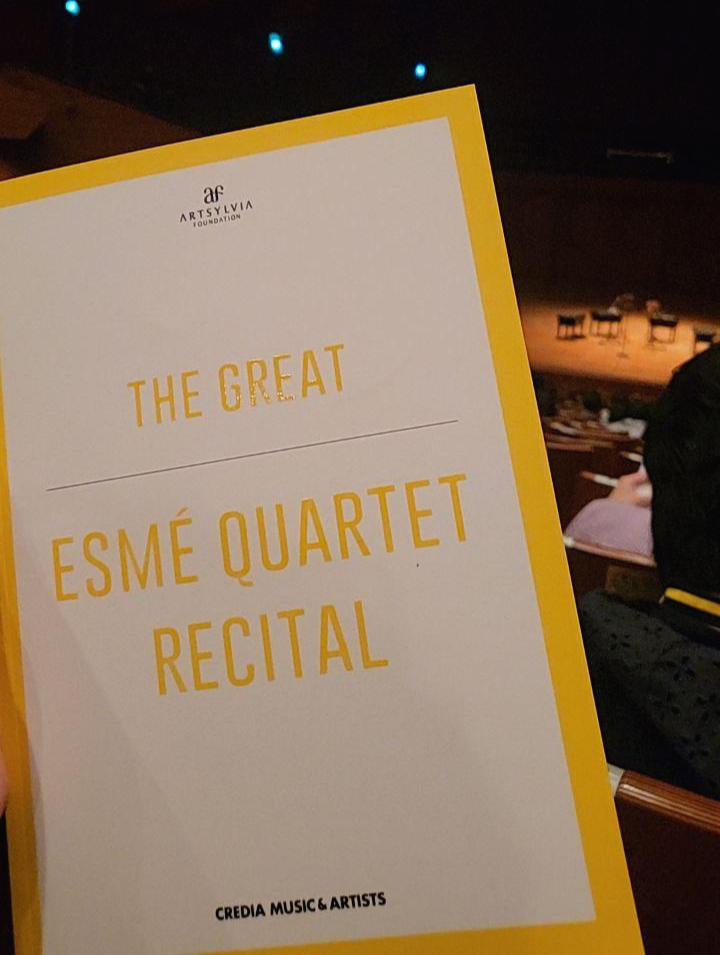
오늘 공연의 프로그램이었다.
===========================<1부>==================================
Felix Mendelssohn-Bartholdy -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op.13
Alexander Borodin - 현악 사중주 2번 D장조
===========================<2부>==================================
Ludwig van Beethoven - 현악 사중주 13번 Bb장조 op.130(with 대푸가 op.133)
+ 앙코르 곡
Stephan Koncz - A New Satiesfaction(Arr. from E.Saite's Gymnopedie No.1)
Leroy Anderson - Plink, Plank, Plunk!
Astpr Piazolla - 천사의 밀롱가
=================================================================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은, 그가 남긴 실내악곡 중에서도 특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변화무쌍하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연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연주곡은 이 곡이었는데, 정말 몰입하면서 들었다. 1악장이 끝나고 터져 나온 박수는(사실 공연 내내 악장 중간 박수가 나오긴 했지만...) '아 이 정도 연주면 박수 나올만하지' 싶을 정도였다. 2, 3악장도 멋진 연주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유지하면서도, 중간에 미묘하게 바뀌는 듯한 음색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악장에서 앙상블이 살짝 흐트러지는 것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이어지는 곡의 분위기 덕분에 곡의 감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여담으로 이 곡의 작곡 배경은 나도 팜플랫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들으니 한층 이 곡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두 번째 곡인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은, 특히 1악장과 3악장의 멜로디가 무척 인상적이지만 시종일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에 자칫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잘 연주하기는 대단히 까다로운 곡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곡 역시 꽤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작은 다이내믹에서 얼마나 섬세한 연주를 하는지가 곡의 완성도를 한 층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3악장의 끝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잘 살려낸 것 같았다. 대조적인 분위기의 2, 4악장도 괜찮은 연주였다. 음반을 통해 들었을 때, 4악장은 '왜 갑자기 이런 곡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뜬금없단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공연을 통해서 가장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사실은 두 파트가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느린 템포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격렬한 템포로 이어나가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베토벤 현악 사중주 13번은 가장 좋아하는 현악 사중주 곡이다. 각 악장이 분명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또 각 악장이 필요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은 흔한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일 뿐이었지만 익숙해지니 이 곡만큼 듣는 재미를 느끼는 곡도 없는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마지막 악장이 대푸가든 새로 쓴 피날레든 1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모로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연주에서는 마지막 악장을 새로 쓴 알레그로가 아닌 대푸가를 연주를 했다.
사실 1부에 비해서 2부는 감상하는 것이 썩 쉽진 않았는데, 관객석의 분위기가 한층 산만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1악장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템포와 악상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악장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잘 컨트롤하여 대비가 확실히 되는 연주를 기대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격렬한 분위기의 2악장과 들을 때마다 어딘지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3악장은 마음에 들었고, 변주곡 스타일의 춤곡인 4악장은 그동안 들었던 음원들 때문인지 다소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오늘 연주처럼 템포를 잡는 것도 설득력이 있단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카바티나! 후기 현악 사중주에서 13번을 최애로 택하게 된 결정적인 악장이라, 무척 기대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와는 반대로 살짝 빠르게 연주를 해서 약간 아쉽긴 했다. 하지만 연주는 진짜 마음에 들었다. 그냥 흘러가는 듯한 단순한 느낌의 멜로디지만 듣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며 감성에 젖곤 하는데, 음반에 비해서 훨씬 그 강도가 셌다. 특히, 정말 조용하게 흐르는 레터 B부분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카바티나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대푸가가 연주되었는데, 마지막 악장을 대푸가로 연주를 한다면 쉬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대푸가가 이 곡의 일부였음을 알려주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란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꽤 많이 들었기에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대푸가지만 실연으로 들으니, 스트라빈스키가 괜히 이 곡을 '시대를 앞서간 영원히 현대적인 곡'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조금만 삐끗해도 엉망으로 흘러가는 곡을 연주해나가는 연주자도, 곡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내 집중을 해야 하는 내게도 도전적인 곡임을 깨달았다.
앙코르 곡으로는 위에서 적은 총 3곡을 연주했는데,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연주가 되었지만 피아졸라 곡을 제외한 두 곡이 무척 가벼운 분위기의 곡이라서 듣는데 크게 지장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앙코르 곡들로 인해서 대푸가의 인상이 조금은 흐릿해진 점이랄까? 누구라도 난해한 대푸가보다는 르로이 앤더슨의 대중적인, 거기에 중간중간 손뼉을 차는 퍼포먼스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나.
첫 번째 앙코르 곡을 마치고 리더인 배원희 씨가 국내에 돌아와서 연주하는 소회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아직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연주자의 고달픔이 절절히 전해지는 듯했다.
오랜만에 다녀온 공연이었는데 꽤나 만족스러웠다. 통제된 환경에서 정제된 형태의 음반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실연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벌려놓은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슬슬 공연도 다시 가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호도가 있기는 한데, 이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히 써보고,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Classical Music > 내맘대로공연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1106]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서울 (4) | 2022.11.07 |
|---|---|
| [20220903]파보 예르비&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0) | 2022.09.03 |
| [20210811]기타리스트 박규희 리사이틀 <아마빌레> (0) | 2021.08.12 |
| [20201017]박규희 데뷔 10주년 기념공연(@롯데 콘서트 홀) (2) | 2020.10.17 |
| [20191018]서울시향-장이브 티보데의 생상스① (2) | 2019.10.19 |